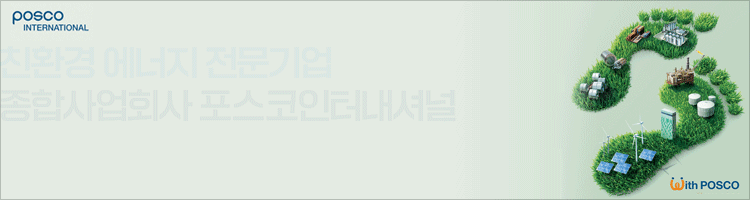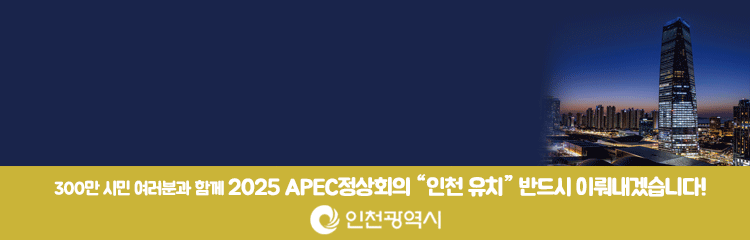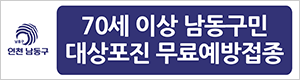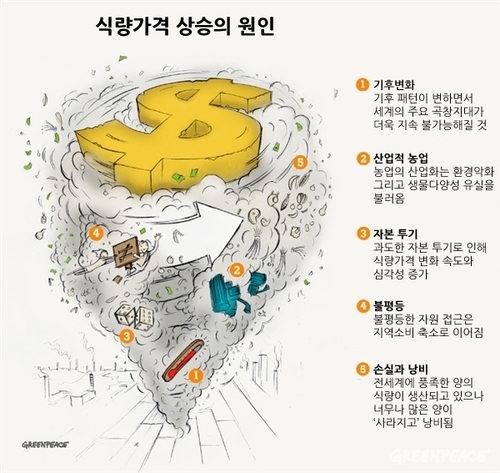|
우리나라 무역규모가 세계에서 9번째로 1조 달러를 돌파했다. 5일 지식경제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교역동향(1월1일~12월5일)을 잠정집계한 결과 수출은 5150억 달러, 수입은 4850억 달러, 총 무역규모는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수출입을 합산한 교역규모가 1조 달러를 넘긴 나라는 미국, 일본 등 8개국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한 후 경제개발 50년 만에 1조 달러를 넘볼 만큼 수출은 매년 눈부신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수출체질도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 대외적인 교역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시밭길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9번째로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하는 것은 적잖은 의미를 지닌다. 지식경제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해방 이후 1946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오징어와 중석(텅스텐)으로 주로 중국과 일본에 연간 350만 달러를 팔았다. 이후 1960년대에는 철광석과 무연탄, 오징어, 흑연, 돼지털 등 광물과 농수산물이 주요 수출품목으로 자리매김 했다. 1970년대에는 기존 농수산물 대신 가발, 섬유, 합판, 신발 등 경공업 제품이 새로운 수출 주력품목으로 떠올랐고, 1980년대에는 의류, 철강, 선박, 영상기기 등이 한국경제를 뒷받침하는 수출효자 노릇을 했다. 90년대 이후에는 조선,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휴대전화 등이 현재의 수출시장을 이끌고 있다. 수출금액 역시 1946년 350만 달러로 출발해 1964년 1억 달러를 넘긴데 이어 1971년 10억 달러, 1977년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수출이 급성장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치인 5000억 달러를 넘기면서 65년 만에 수출액은 10만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역시 수출실적 5000억 달러 달성이 유력해지면서 우리나라는 1971년 수출 10억 달러에서 40년 만에 500배나 증가하는 놀라운 성장을 구가했다. 이는 1971년 이후 지난해까지 수출증가율이 연평균 16.9%를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체질이 변화하는 만큼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나날이 발전을 거듭했다. 1950년 당시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순위는 85위, 10년 뒤인 1960년에도 88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후 1970년 43위로 급상승한데 이어 1980년에는 26위로 뛰어 올랐다. 1990년과 2000년 각각 11위와 1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영국과 이탈리아와 벨기에 등을 제치고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에 이어 사상 최초로 7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했다. 1950년 이후 세계 수출시장에서 7위권에 신규 진입한 국가는 한국(2010년)과 함께 일본(1959년), 중국(2000년) 등 3개국에 불과하다. 올해 역시 우리나라는 2년 연속 세계 수출 7강을 달성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올해 한국의 수출전선은 연초부터 세게 곳곳의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험로를 걸었다. 2월에는 리비아, 이집트, 튀니지 등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중동 및 북아프리카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중동 사태가 수출리스크로 부각됐다. 중동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리비아 유혈사태 등으로 중동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중동발 리스크가 자칫 오일쇼크와 같은 악재를 양산할 경우 수출시장은 적잖은 충격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유럽연합(EU)의 재정위기 악화로 소비심리가 경색되면서 현지 시장진출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올해 무역 1조 달러 진입의 원년으로 삼고 60년 만에 교역규모 1조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한 정부의 장밋빛 전망을 수정해야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감돌았다. 그럼에도 한국 수출은 선전했다. 선진국에 의존하지 않고 신흥 개도국 진출을 강화하면서 위기를 헤쳐 나갔다. 상반기만 해도 올해 1~6월 기간 동안 수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24.4% 증가한 2754억 달러, 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6% 증가한 2580억 달러로 선진국과 신흥국 수출이 비교적 골고루 증가해 교역규모 5000억 달러를 넘겼다. 올 상반기에는 컴퓨터와 IT제품의 수출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석유제품과 선박·자동차 등 수출 주력품목의 수출상승세는 유효했다.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됐다. 상반기 다소 부진한 IT분야도 계절적 성수기와 가격상승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에 수출 증가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또 석유제품, 석유화학 품목 등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으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9월 들어 수출시장에는 다시 위기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전월(8월) 수출실적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1% 증가한 463억8400만 달러, 수입은 29.2% 증가한 455억6300만 달러, 무역수지는 8억21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흑자폭이 대폭 감소했다. 지식경제부는 글로벌 재정위기 여파와 8월 계절적 요인의 특성, 사상 최대치의 수입 등으로 인해 무역흑자폭이 크게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수출시장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미국과 유럽 등의 재정위기가 점점 심화되면서 주요 선진시장에 대한 수출이 뚝 떨어졌고 이 같은 흐름이 하반기에 더욱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해졌다. 실제로 미국발 악재는 이미 올해 수출에 적잖은 타격을 주고 있다. 미국 경기회복의 둔화는 소비수요 위축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른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역시 탄력을 잃었다는 게 수출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유럽 내 재정위기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란 점도 악재로 꼽힌다. 그리스는 EU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았지만 경기후퇴의 가속화로 부채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과 이탈리아, 헝가리 등 유럽 재정위기는 확산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아직 지배적이다. 스페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정치적 불안, 저성장추세, 지방정부의 재정목표 미달성 위험 등으로 재정위기 전이 가능성이 부각됐고, 이탈리아 역시 지하경제의 비중이 높아 세수기반이 취약한데다 관대한 연금제도로 사회보장지출이 과다해 재정위험이 가중돼 위기감이 고조됐다. 이런 상황에서 헝가리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럽 재정위기가 동유럽으로 전이될 조짐이 일고 있다올해 10월 현재까지 무역수지는 21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하반기 수출증가세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박,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확대되면서 비교적 호조세를 나타냈다.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은 1~10월 현재 석유제품 411억5300만 달러, 철강제품 299억800만 달러, 자동차 345억4900만 달러, 자동차부품 185억2500만 달러, 선박 471억1200만 달러, 무선통신기기 226억5200만 달러, 반도체 400억1400만 달러, 섬유 127억6800만 달러 등으로 주로 IT품목과 함께 선박, 자동차 등이 올해 수출시장을 이끌었다. 지난해부터 정부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개도국 수출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무역수지는 약 227억 달러 이상 흑자로 선진국에 대해선 385억2100만 달러 적자지만, 개도국에 대해선 609억93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이 기간 지역별 수출도 선진국 비중은 27.2%인 반면, 개도국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2.7%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재정위기감으로 내수가 침체된 선진시장 대신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새로운 신흥시장 발굴·진출 전략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도국 가운데 대(對)중국 수출비중이 24.1%로 가장 높고 아세안 13.0%, 중남미 7.3%, 중동 5.7%, 아프리카 2.8%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올해 1~8월 현재까지 주요 경쟁국과의 수출증가율을 비교하면 한국은 지난해 동기보다 23.5% 증가한 반면, 미국 17.8%, 중국 23.6%, 독일 22.5%, 일본 8.7%, 프랑스 17.9%, 영국 23.2%, 벨기에 22.3%, 이탈리아 23.2% 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진현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1962년도에 처음 시작한 이래, 약 50년 만에 무역 규모 1조 달러 달성이 기대되고 있다”며 “10월 말까지 누계 교역액이 8988억 달러, 또 월평균 교역규모 910억 달러 정도를 감안할 때 12월 초 정도 되면 무역 1조 불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낙관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