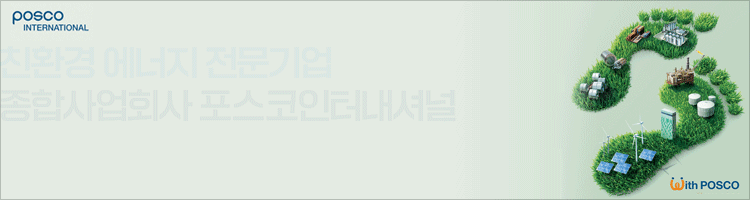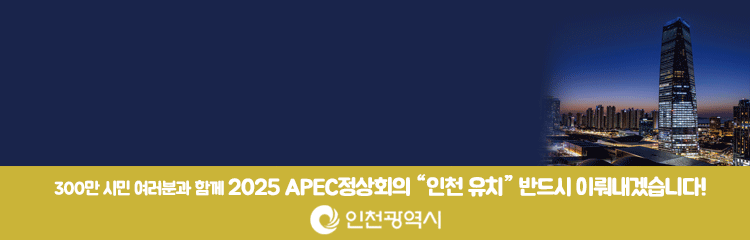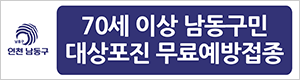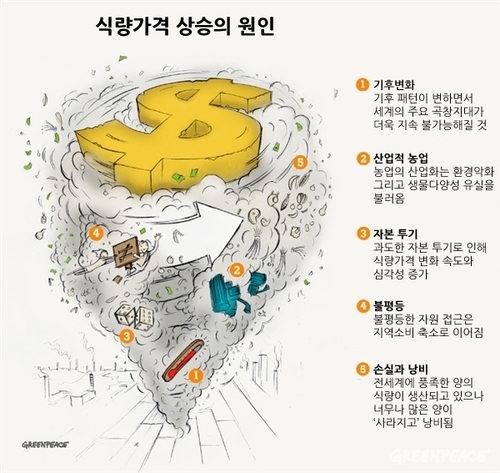|
사진내용; 7일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궤도차량에 탑재된 나로호(KSLV-1)가 발사대에 장착되고 있다.
우주에는 임자가 따로 없다. 하루라도 먼저 위성을 쏘아올려 우주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나라는 계속해서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다. 우주개발은 이래서 중요하다.
오는 9일 한국은 최초의 위성발사체인 나로호를 우주로 실어보낸다. 우주주권(宇宙主權)을 확보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작년 1차 발사시에 문제가 됐던 페이로드 페어링1) 분리시험을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기 위해서는 우주기술의 3대축인 위성, 발사대, 발사체관련 기술 등 3박자를 고루 갖추어야 한다. 특히, 2단으로 된 엔진이 위성을 궤도로 올릴 수 있는 추력(推力)을 가져야 하고, 엔진과 페이로드 페어링이 적시에 분리돼야 한다. 이를 위해 1단의 액체엔진과 2단의 고체엔진, 그리고 페이로드 페어링과 관련된 발사체 시스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일본·유럽·한국 등 4국에 각각 출원된 발사체 시스템관련 특허기술은 모두 1280건이며, 2004년까지는 연평균 60여건 정도 출원되던 것이 2005년에는 131건이 출원됐고 그 이후는 80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에 구소련 붕괴와 예산투자의 어려움으로 주요 우주 개발국의 예산이 감소했다가, 2005년 이후 미국이 국방프로그램을 증가시키고 중국 등 후발국들이 우주개발에 본격 참여한 결과로 보인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주산업의 선두주자인 미국은 이 기술분야에서 601건의 특허출원을 기록해 4국 전체출원의 약 47%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일본 29%, 유럽 13%, 한국 11%의 순이다.
특히, 미국 등 선진 3국의 출원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한국은 특허출원 143건 중에서 80%인 114건이 2000년 이후에 출원됐다. 이는 2000년대 들어 우주개발에 대한 관심증대와 함께 정부의 과감한 투자확대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기술분야별로는 고체로켓 분야가 571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액체로켓 분야가 567건, 페이로드 페어링 분야가 142건으로서 고체로켓 및 액체로켓 분야가 비중있게 개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액체로켓 분야는 다른 기술분야와 대비해 2005년 이후 급격하게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별 다(多)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고체로켓 분야에서는 75건을 출원한 육·해·공군이, 액체로켓 분야에서는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가, 페이로드 페어링 분야에서는 보잉과 록히드마틴 등 항공사가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고체로켓 분야는 닛산자동차가, 액체로켓 분야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페이로드 페어링 분야는 카와사키 중공업이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은 내국인 출원비율이 전체의 72%이며, 항공우주연구원이 액체로켓 분야와 페이로드 페어링 분야에서, 국방과학연구소가 고체로켓 분야에서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우주를 선점하려는 노력은 한국은 물론이고, 선진국이나 신흥 강국 모두의 공통점이다. 특히, 일본은 최근 세계 최초로 태양광에너지만을 이용해 금성까지 항해하는 우주범선과 지구 이외의 행성에 대한 기상관측 위성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은 1958년 “미국과 소련이 하면 우리도 한다”고 한 마오쩌둥의 우주개발선언 이후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이어져 최근은 유인우주선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가 하면 달 착륙선과 유인 달 탐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국의 우주개발경쟁에 힘입어 세계 우주산업에 대한 정부 부문의 투자액은 2001년 400억달러 수준이던 것이 2006년에는 약 504억달러에 이르러 연평균 5% 가량의 높은 성장을 보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국내 우주 산업이 2000년대 이후 정부부문의 투자 확대로 생산규모가 2003년 156억원에서 2008년 1630억원으로 연평균 60%라는 높은 성장을 기록한 점이다.
국내 우주개발은 1992년 한국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선진국에 약 40년 뒤진 채 출발했다. 발사체 기술은 정밀기계, 자동제어, 신소재 등 첨단기술에 IT가 융합된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산업에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크게 줄어든 지금은 “일본과 중국이 하면 우리도 한다”는 전략과 투자가 필요하다.
KAIST 항공우주공학과 이 인 교수는 “위성제작기술과 운영기술은 수차례의 위성개발 경험을 통해 상당부분 체득한 상태여서, 발사체 부분의 독자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진정한 세계 10대 우주강국이 될 것이며, 나아가 우주기술의 특허권 확보를 통해 우주산업의 세계시장 진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