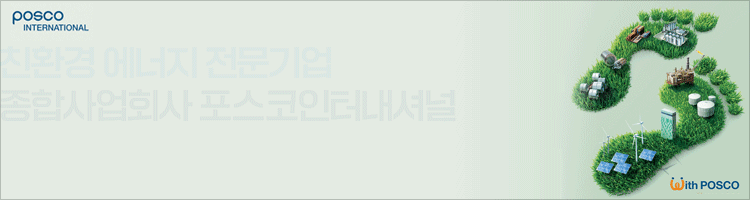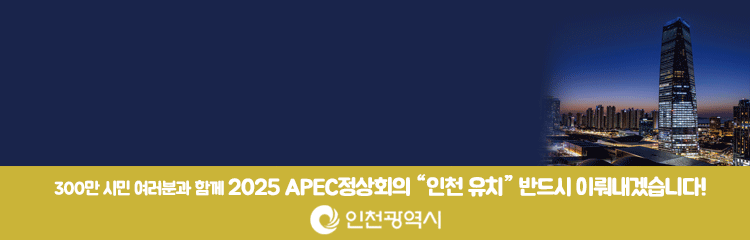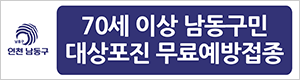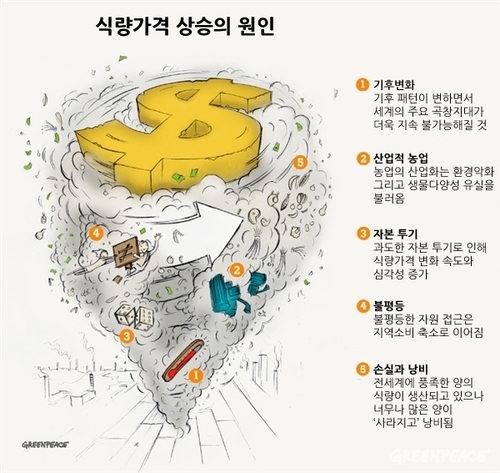|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에 반대하며 1979년 10월 16일부터 닷새간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 퍼진 반독재 민주화 운동으로 부산과 마산의 첫 글자를 따 ‘부마항쟁’이라고 명명됐다. 당시 시위는 부산대 학생과 시민들이 주축이 돼 시작됐고, 사태가 확산되자 임시 휴교령, 비상 계엄령, 위수령 등이 잇따라 선포됐다. 이 과정에서 1560여명이 연행됐고 군사 재판에 회부된 시민만 120여명에 달했다. 부마항쟁의 민주화 열기는 이후 10·26을 촉발해 유신붕괴를 앞당겼고, 5·18과 6월 항쟁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부마항쟁은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부마항쟁의 발원지인 부산대 학생들도 5·18민주화운동과 6·10항쟁은 알지만 부마항쟁은 잘 모른다는 조사가 있을 정도이다. 5·18은 1997년에, 6·10은 2007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부마항쟁은 세 항쟁 중 가장 앞서 일어났지만 40년이 흐른 최근에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1979년 10월15일 오전 부산대 곳곳에는 ‘민주선언문’이라는 유인물이 뿌려졌다. 학원민주화, 언론자유, 인권보장, 유신헌법 철폐, 유신독재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오전 10시 도서관 앞에서 시위가 예정됐으나 무산됐다. 시위 주도자가 학생 동원에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학생들이 모이기 전 학교를 빠져나가버린 것이다. 시위 불발을 지켜본 정광민씨(61·당시 경제학과 2년·현 부마항쟁연구소 이사장)는 교내 시위를 주도하기로 결심하고 전도걸(경제학과 2년)·엄태언·박준석(이상 경영학과 2년)씨와 함께 ‘선언문’이라는 유인물 300장을 만들었다. 정씨는 ‘청년학도여 지금 너희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시작하는 선언문에서 재벌중심의 경제정책, 소득분배의 불균형, 불합리한 사회의 문제점 등을 비판했다. 유신헌법 철폐, 학원사찰 중지, 학도호국단 폐지 등을 요구하는 ‘폐정개혁안’도 넣었다. 정씨는 “운동권도 아니었고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40년이 지나서 보니 지극히 평범했던 준석이와 도걸이가 등사기, 줄판 들고 우리집에 와서 어떻게 유인물 등사를 했는지… 그래서 역사는 바뀌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16일 오전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강의실에 선언문이 뿌려졌고 오전 9시53분 인문사회관 앞에 학생 100여명이 모였다. 정씨는 ‘자유’라고 쓴 종이를 들고 대열을 선도했다. 학생들은 ‘우리의 소원’ 노래 가사 중 ‘통일’을 ‘자유’와 ‘민주’로 바꿔 부르며 행진했다.  학생들은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교문 밖 진출을 시도했다. 최루탄이 터졌고 학생들은 교내로 흩어졌다. 학생 수백명이 온천동, 명륜동을 지나 거제동 부산교대 앞까지 가두시위를 벌였고 시내버스 승객들은 박수를 치며 이들을 격려했다. 진압경찰을 맞닥뜨리면서 시위대는 “남포동으로”를 외치며 해산했다. 오후 2시 남포동 부영극장(현 비프광장)과 미화당백화점, 국제시장 등지에서 시위가 이어졌고 시민들이 동참하기 시작했다. 가로수 지지대를 뽑아들고 경찰의 최루탄과 곤봉에 맞섰다. 최루가스로 시위대가 흩어지면 경찰은 골목 구석까지 추적해 시위자를 구타하고 연행했다. 경찰의 진압에 해산과 집결을 반복하면서 17일 오전 1시까지 34차례 시위가 전개됐다. 시위와 진압에 휩쓸려 자리를 피하지 못한 평범한 시민들도 마구잡이로 구타당하고 연행됐다.  17일 은 동아대생들이 시위를 이끌었다. 유신 선포 7주년을 맞은 날이다. 동아대생 500여명은 오전부터 교내에 모여 연좌시위에 돌입했다. 오후 1시쯤 1000여명이 정문 밖 진출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최루탄 진압에 흩어지고 말았다. 오후 6시 동아대생 1000여명이 남포동 부영극장 앞에 모였다. 4~5명씩 어깨동무를 하고 ‘선구자’ ‘애국가’를 부르며 “유신철폐”와 “독재타도”를 외쳤다. 동아대 시위를 주도한 이동관씨(법학과 3년)는 “16일 시위를 17일 학교에 가서 알았다. 시위를 주도할 생각은 없었는데 동아대도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임시 휴교된 부산대생들은 오전 교내 시위를 벌인 뒤 남포동으로 모였다. 남포동 시위는 오후 6시 이후 시민이 대거 참여하는 형국으로 바뀌었다. 회사원, 공장 직원, 단순노무자, 재수생, 선원, 공무원, 상인, 운전기사 등이 시위에 합류했다. 국제시장 상인들은 경찰에 쫓기는 시위대를 숨겨주고 가게문을 내렸다. 먹자골목에서는 시위대에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저녁 해병 1432명과 3공수특전여단을 투입했다. 정부는 조직적 파괴행위라고 발표하며 18일 0시를 기해 부산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시내 중심가에는 탱크, 장갑차가 배치됐고 계엄군은 소총에 착검을 한 채 시위대를 개머리판으로 폭행하면서 진압했다. 16~18일 부산 시위로 학생 397명 등 시민 1058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마산에서는 경남대생들로부터 시위가 시작됐다. 경찰이 제지하자 투석전이 벌어졌고 후미에 있던 학생들은 학교 담을 뛰어넘거나 야산을 넘어 시내로 진출했다. 학생들이 시내로 이동하면서 고등학생, 공장노동자, 농부 등 일반 시민들이 시위에 가세했고 학생과 시민 1500여명이 “유신철폐”를 외쳤다. 경찰이 950명 동원됐으나 진압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였다. 19일 오전 1시까지 시위가 이어졌고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다시 시위가 시작돼 산발적으로 뭉쳤다 흩어졌다를 반복했다. 18~19일 이틀간 시위로 25개 관공서와 건물 100곳이 파손됐다. 연행된 사람은 학생 56명 등 506명이었다. 20일 0시45분을 기해 1공수특전여단 2개 대대가 마산에 도착하고 오후 2시에는 5공수특전여단 1458명이 투입되면서 시위는 잦아들었다.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시민 항쟁을 직접 목격한 뒤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차지철 경호실장은 강경진압을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차 실장을 옹호하면서 부마항쟁 발생 열흘 뒤인 10월26일 김 부장이 박 대통령을 시해하면서 유신체제는 끝을 맞았다.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낸 조사보고서에서 “부마항쟁은 ‘박정희 유신정권을 붕괴시킨 계기’를 마련한 항쟁”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뚜렷한 조직적 지도부 없이 전개된 항쟁으로 5일 만에 종료됐지만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 대규모 반독재 민주항쟁의 계보를 잇는 항쟁”이라고 평가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